|
현대연극은 정말 오랜만이다!
그간 따로 찾아볼 기회도 없었고
내가 현대연극을 찾아보던 때는
현대음악을 작곡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기에..
게다가 이번 연극은 몸을 사용하는 철학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현대무용의 요소들도 여럿 있어서 좋았다.
배우들을 보며 늘 느끼는 거지만
낯선 사람의 극에서 특히 느낀 포인트가 있다.
만능으로 잘해야 하는구나!
몸짓 또한 연기의 일부구나 느꼈고
바넷사 린은 토스카라는 오페라의 여주인공을 맡은 소프라노의 역할로 토스카 일부의 노래들을 부른다.
마찬가지로 리웨이도 오페라 토스카의 남주인공으로 나오기에 같이 노래를 한다.
(리웨이역의 한진만님은 실제 토스카를 공연하셨고 필모가 오페라가 많아서 놀랐다!)
배우들은 노래도 잘 불러야 하고 또 잘 부르는구나 느꼈다.
어느 순간부턴가 연극을 보면 연출, 감독, 음악 등에 감탄을 하지만 배우에게는 늘 존경심이 남는다.
아무래도 이 극의 주인공은 울리히와 그 역을 맡은 배우 김정환님이 아닐까 한다.
여러모로 극 중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치신 게 인상이 깊었고 그 여운이 아직도 가시질 않는다.
특히 마지막에 입고 있던 옷가지들을 벗고
자신에게 총을 겨누며 죽을 때.
그전에 격정적으로 싸우며 분노를 했던 전의 상황에서 돌연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는데 경이로웠다.
아쉬웠던 역할은 천샤오보의 안병찬님.
할아버지 역을 소화해내기에 어리고 훈훈한 비주얼의 마스크를 가지고 계셨고, 콧수염이라도 달았다면... 하는 소품의 아쉬움이 남고 젊은 목소리가 NG였다.
물론 감옥에서의 젊은 독립운동가에는 잘 맞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맞춘 변화가 미비해서 아쉬웠다.
다소 난해한 요소들이 있었다.
의미 부여를 위해 느릿느릿 진행이 되는 부분들.
나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 행동과 대사가 한,두개였다면 지루하지 않았을 텐데
바넷사린과 천샤오보가 나오며 본격적으로 극이 시작하기 전의 모든 부분이 어리둥절하게 했다.
불필요한 슬로모션은 극을 지루하게 했다.
의미 부여를 위한 시간의 부여가 과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연극을 보고 난 후엔
연극의 앞부분이 잔상처럼 희미하게 떠올랐다.
음악도 인상 깊었다.
음악을 전공하는지라 여러 요소가 궁금했는데
프로그램북에 음악감독의 코너가 있어 신기했다.
음악감독이 연극의 스토리에 맞춰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적나라한 작업노트가 있어 흥미로웠다.
보통 연극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어쩌면 사소할지 모르지만 감독은 음악-인테리어 등의 연출에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졌다.
음악들은 모두 작곡가가 작곡을 한지는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레퍼런스를 삼고 작곡을 하셨구나 느낄 만큼 여러 곡들이 연상되었다.
영화 히치콕의 the murder 음악이 연상이 되었다.
음악도 한곡 한곡 공들여 설정한 세심함이 느껴졌다.
각각의 분야에서 탄탄하게 작업한 것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가 잘 된듯하다.

인테리어도 인상 깊었던 한 가지.
무대와 소품들, 배우들의 의상이 모두 화이트 컬러였다.
같이 관람한 지인이 흰색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
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원초적인 순수와 "순결"의 상징이라고 답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독립운동가 천샤오보를 극적으로 살려준 울리히, 죽이려던 찰나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풀어준 후의 울리히의 심정과
마지막 모든 옷을 벗고
자신에게 총을 겨누며 자살하는 울리히의 관점에서 나는 순결을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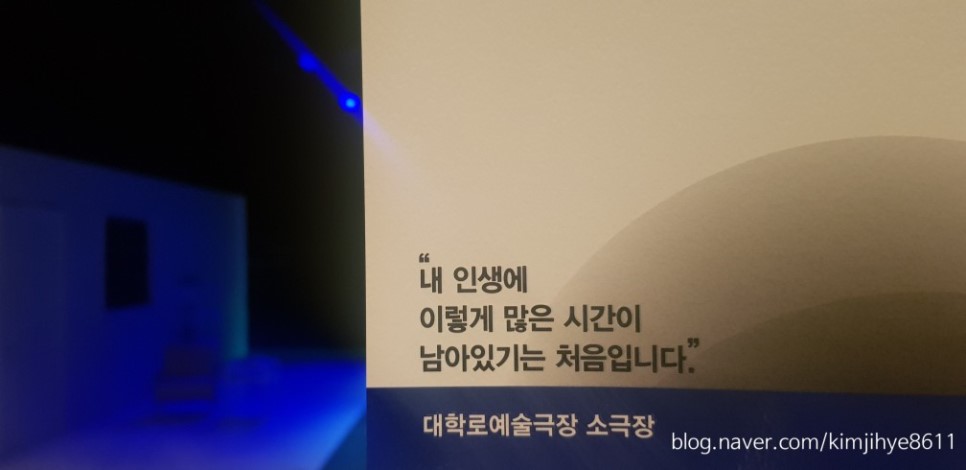
또한 교도소에서 죽기 전 천샤오보는
사전에서 정의한 "순결"의 의미대로 마음에 사욕(私慾), 사념(邪念) 따위와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
한치의 부끄러움과 욕심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무념무상"의 상태인 것도 같았다.
울리히가 자신(천샤오보)에게 총을 겨누던 때도
먼 훗날 손녀와 함께 노후를 보낼 때도
그는 "순결"했다.
내게 질문을 던져준 지인은 "항복"의 의미로 해석했는데 그 포인트가 신선했다.
마지막 자살을 하는 울리히를 보며 "항복"의 의미로 해석했다고.
나에게 가장 와닿은 포인트는 서로의 상처와 감정선이었다.
사람이 어느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온갖 힘을 소진하며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죄책감 때문인지 자신의 소행을 다하지 못하고 풀어주고,
몇십 년 세월이 흘러...
무념무상으로 살아온 듯한 늙은 할아버지와
그를 쫓아다니는 회색빛의 그림자.
정신병원에 오랜 세월을 사신 듯한 또 다른 할아버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겉의 상황은 종결되었지만
몇십 년의 세월을 꽤 깊은 상처로 짊어지고 살았고, 살아야만 했던 그 아픔의 깊이가 느껴졌다.
어쩌면 그 둘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그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세세한 사정과 아픔이 되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지만.
배경과 의미 부여 등등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나와 지인 또한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대답이 정해지지 않은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연극이라 의미가 깊고 여운이 길다.

플레이티켓 김지혜의 글입니다.
|